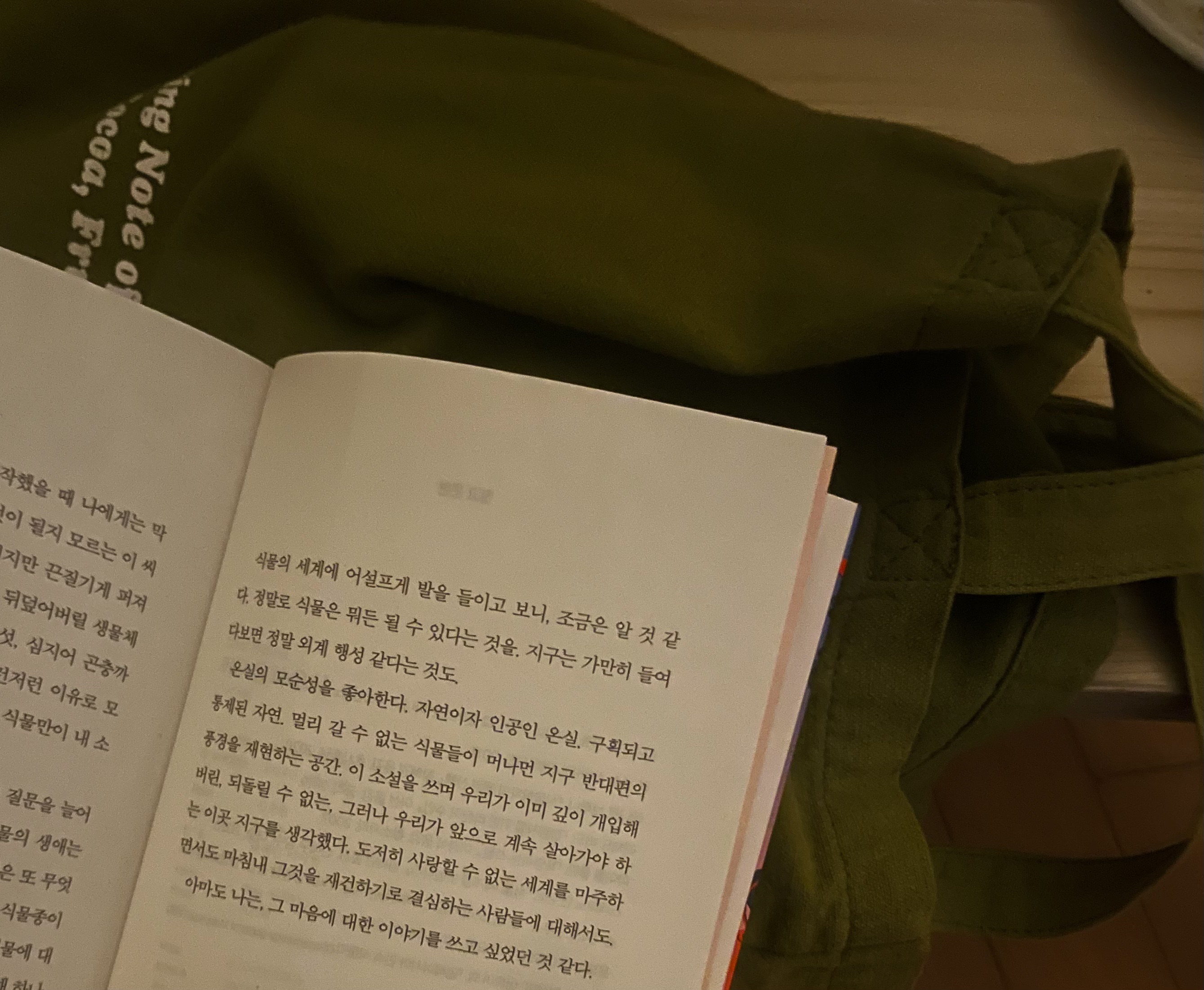
집 근처에 작은 화원이 하나 있다. 회사에서 집을 오갈 때나 커피를 사러 갈 때마다 눈길이 가는 가게였다. 화려한 화원은 아니었고 통창 뒤로 아기자기한 초록 잎을 달고 있는 작은 크기의 화분들이 있는 단아한 가게였다.
지나가면서 ‘언젠가 한 친구를 집에 데려가고 싶네.’ 라고 생각했다.
레옹의 마틸다처럼 멋지게 화분을 들고 집까지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상한 상상을 하며 혼자 웃었다.
하지만 몇 개월째 그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지는 않았다. 그 당시 꽤나 지친 상태였던 것 같다. 움직이지 않는 작은 크기의 식물 하나를 키우는 데에 필요한 책임감을 갖는 것도 쉽지 않았다. 우리 집에 나를 제외한 또 다른 생명체를 들인다는 것은 고민이 필요했다. 어렸을 적 잘 돌보지 못했던 전적도 있었고, 화원에서 생명력을 뿜어냈던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시들시들해지면 상심할 것 같았다.
문득 어릴 적 할머니 집 근처 동사무소 건물이 떠올랐다.
그 건물은 4층으로 이루어진 큰 건물이었다. 창문과 사람이 드나드는 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건물이 담쟁이넝쿨로 뒤덮어져 있었다.
처음 봤을 때 무언가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넝쿨이 건물을 집어삼킨 것 같았다.
바람이 강하게 불때면 담쟁이넝쿨 잎들이 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휘날려서 건물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다.
바람에 부딪혀 나는 소리들은 넝쿨들이 웃는 것 같았다. 아름다웠다.
겨울이면 잎들은 사라지고 앙상한 가지들만이 건물을 뒤 감고 있었다. 겨울이 되어서야 그 건물이 붉은색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 다시 초록색 막이 건물을 뒤덮었다.
참 신기하다. 자연 속에서는 바이러스와 곰팡이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하며 뒤덮을 수 있는 존재인데 실내로 데려왔을 때는 적절한 빛과 적절한 주기의 적절한 물을 누군가 주입해 주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토록 연약하고 까다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불현듯 신기하다.
외할머니가 떠올랐다. 늘 식물을 사랑으로 보살피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할머니가 돌보는 식물들은 항상 싱그럽고 집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할머니는 항상 식물이 감정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셨다. "물을 먹으니 행복한가 봐.", "바람이 부니 기분이 좋은가 봐." 할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나도 때때로 그들에게 말을 걸거나, 그들의 기분을 생각하고는 했다.
책을 읽으며 나와 식물 사이에 있었던 크고 작은 추억들이 떠올랐다. 비좁은 바위와 나무 틈을 비집고 머리를 내민 그들의 강인함에 놀랐던 순간들.
언제나 나의 발밑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킬 앤 하이드 (0) | 2025.04.12 |
|---|---|
| 요즘 읽은 글 (0) | 2025.03.24 |
| 숨결이 바람 될 때 (2) | 2025.01.07 |
| 2024.12.10 일기 (0) | 2024.12.12 |
|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1) | 2024.02.12 |